돈 잘 버는 크리에이터? 대세는 Web 3!|김승주 교수 [쿠앤에이]
📌 먼치 POINT
웹의 진화와 웹 3의 등장
웹 1 시대는 정보 소비 중심의 수동적 이용 환경
웹 2는 사용자가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 시대
웹 3 시대는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권한과 보상을 제공함
기존의 일방적 플랫폼 구조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분산 생태계 추구
웹 3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과 미래 전망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을 쉽게 해주는 도구로, 크리에이터의 접근성을 높임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블록체인은 참여형 거버넌스를 가능케 함
미래에는 웹 1, 2, 3의 서비스의 장점이 공존하는 혼합형 생태계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큼
열린 태도로 변화하는 웹 환경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
웹의 진화 과정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에서, 인터넷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웹 3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 웹 3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웹(web)’이라는 단어는 거미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인터넷 창 주소가 ‘WWW.’로 시작합니다. 이 WWW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더 줄여서 그냥 한 글자로 웹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편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었죠. 그러다가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이 나오면서 대중적인 인터넷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웹 1 시대: 수동적 소비의 시대
웹이라는 기술의 특징 중 하나는 ‘연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보면 특정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밑줄 친 글자를 클릭하면 연관된 사이트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이 처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시대를 웹 1 시대라고 합니다.
웹 1 시대의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수동적인 패턴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이 만든 글이나 기사를 수동적으로 읽어보는 데 그쳤죠. 이렇게 1990년부터 시작된 웹 1 시대가 15년 정도 진행되다가, 2004년 웹 2 시대로 진입합니다.
웹 2 시대: 프로슈머의 등장
웹 2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글이나 그림을 타인과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웹 1 시대와 달리, 웹 2 시대에서는 이용자들이 생산자(producer)이자 소비자(consumer)인 프로슈머(prosumer)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시대에는 프로슈머들이 만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장터를 만든 플랫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웹 3 시대: 크리에이터 중심 생태계
웹 2 시대가 시작된 후 또다시 15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고 웹 3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웹 2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에이터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이렇게 작고, 크리에이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도 제한적일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웹 3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웹 3 시대는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자는 사람들이 열어젖혔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을 표방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크리에이터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긴 하지만,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삭제되거나,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하는 규칙은 구글과 유튜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웹 3 시대에는 이런 규칙 자체도 크리에이터 이용자들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수익을 나눠주는 것에 더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버넌스 구조까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웹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웹 3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들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
생성형 AI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AI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그럴싸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그림을 만들어준다든가 음성을 만들어주는 AI들도 있죠. 이처럼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모든 AI를 통틀어서 생성형 AI라고 얘기합니다.
웹 3 시대에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은 권한과 이익을 나눠받으려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생태계가 조금 더 편리해져야 됩니다. 유튜버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직접 포토샵 조작부터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콘텐츠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웹 3 시대의 생태계에 있어서,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NFT: 디지털 소유권의 증명
‘NFT(Non fungible Token, 대체할 수 없는 토큰)’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이 콘텐츠는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꼬리표를 붙여놓는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콘텐츠를 내가 만들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콘텐츠에 꼬리표를 달아 소유권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을 NF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분산 거버넌스의 기반
웹 3 시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안에 인터넷 투표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웹 3 시대의 표어는 플랫폼의 규칙을 플랫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규칙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려면, 그 규칙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 인터넷 투표 기능이 블록체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웹 3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이 거버넌스 구조를 지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 3 시대의 핵심 기술을 이야기할 때 생성형 AI, NFT, 블록체인 이 세 가지를 꼽는 것입니다.
웹 시대들의 공존과 미래 전망
중앙 집중형인 웹 2와 거버넌스 체계가 협동조합 구조인 웹 3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는 공존할 겁니다. 어떤 가치관이 이용자들에게 더 먹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구조와 사장되는 구조가 판가름나겠죠.
완벽하게 거버넌스 체계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협동조합처럼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구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웹 2와 웹 3이 장점만 결합된 어떤 중간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의 인터넷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생태계와, 여전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소비만 해야 되는 그런 생태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각종 방송사들은 직접 뉴스를 생산해서 웹사이트에 올리죠. 우리는 그걸 소비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처럼, 내가 콘텐츠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웹 1의 서비스와 웹 2의 서비스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웹 3 시대가 오더라도 웹 1 서비스, 웹 2 서비스, 웹 3 서비스는 전부 다 공존할 겁니다. 어떤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게 이긴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Created by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CC BY 라이선스 | 교정 SENTENCIFY | 에디터 최수아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유튜브 구독자 14.1만명
팔로워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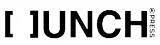




![너 잘났어,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 한석준 아나운서 [쿠앤에이]](/_ni/image?url=https%3A%2F%2Ffile.munch.press%2F20250813%2Fthumb_boardThumbnail_akpghlfd-1755066509065.jpg&w=750&q=75)


댓글
0